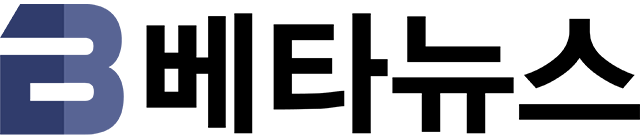입력 : 2012-10-21 22:21:02
요즘 국내 게임계 최고의 화두는 뭘까? 아무래도 '모바일'이 아닐까 싶다.
2009년 싸이월드에 처음 출시됐던 '애니팡'이 카카오톡 플랫폼을 등에 업고 모바일로 선보이자 월 매출 수십억의 대박을 치면서 흥행의 신호탄을 울렸다. 위메이드의 '캔디팡'은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고 일본의 메이저 모바일 게임 플랫폼인 GREE와 DeNA도 한국에 진출했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 강자인 컴투스와 게임빌은 그 입지가 커졌다.
그 인기를 반영하듯 유명 게임사에서 퇴사한 개발자들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세우고 있다.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도 몸값도 덩달아 폭등했다. 그 덕에 지금은 한 달에 무려 4,000개 이상의 모바일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메이저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들마저 모바일 시장 진출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모바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위메이드를 필두로 스마일게이트와 웹젠도 모바일 자회사를 세웠고 모바일 시장을 위해 액토즈소프츠가 샨다게임즈, 스퀘어에닉스와 힘을 합쳤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 웹젠은 '뮤''아크로드''헉슬리''배터리', 라이브플렉스는 '퀸스블레이드', 드래곤플라이는 '스페셜포스2' 등 기존의 흥행 게임을 모바일화해 개발 중이기도 하다. 심지어 엔씨소프트도 일본 모바일 게임사 그리와 협력하여 '리니지'를 개발 중이며, '블레이드앤소울'을 모바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이는 후발 주자인 온라인 게임사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열기가 확대된 것은 반길만 하다. 더 이상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 온라인 게임 시장과 달리 모바일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으로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게임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기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아직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아무리 폭발적 성장세라곤 하지만 최근 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8조원을 돌파했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아직 5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다.
또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게임 플레이 인원 대비 매출 규모가 적고 흥행 장르가 캐주얼로 아직은 한정되어 있으며 게임의 수명이 온라인 게임에 비해 짧고 쏟아지는 게임 수에 비해 흥행 게임의 수가 극히 일부인 것도 우려하는 문제점 들이다. 개발 비용과 인원도 예전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도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얼마 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남궁훈 대표가 '사용자 확대 측면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 규모에선 온라인 게임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듯, 모바일 게임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위메이드는 천룡기와 네드 등 온라인 게임 개발도 주력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출시 뿐만 아니라 한게임재팬의 라임과 제휴하고, 적극적인 일본 공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략에 나서며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모바일에 진출하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가지 장르의 시도와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수익원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말이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목록
목록-
 위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