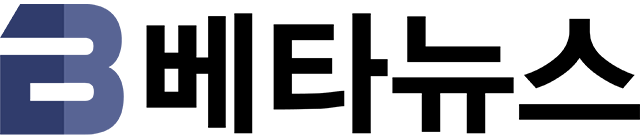입력 : 2011-11-29 14:16:12
최근 프랑스 뮤지컬 ‘모차르트 락 오페라’가 3D 상영관에 올랐다. 뮤지컬을 3D 카메라로 찍어 입체 영상으로 담은 것이다. 애호가들한테 꽤나 호평 받는 뮤지컬인 만큼 반응도 괜찮다.
이를 보니 세상 참 좋아졌단 생각이 든다. 프랑스로 건너가지 않아도, 프랑스 배우를 국내로 불러들이지 않아도 공연 실황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모든 것이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영상을 보면서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작품이 나쁘단 얘긴 아니다. 아마도 이질감 탓이리라. 한 편의 뮤지컬을 입체 영상으로 잘 담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뮤지컬이라 할 순 없다. 연극이나 뮤지컬의 생동감이 빠졌으니 말이다.
일단 배우와 관객 간 호흡이 없다. 멋진 장면에선 으레 박수가 터지지만 이는 화면 속 관객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극장에서 아무리 박수를 쳐도 배우에게 들릴 리 없다. 단지 옆 사람의 따가운 시선만 받을 뿐이다.
뮤지컬에선 주연 뿐 아니라 조연도 자기 역할에 열심이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들을 비춰주기 전엔 그들을 볼 수 없다. 현장이었다면 슬쩍 고개만 돌리면 될 일이다.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주는 것이기에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기도 어렵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꽤 익숙한 말이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물리량을 뜻한다. 디지털은 자료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을 말한다. 말만 들어도 어렵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그냥 0과 1로 똑 부러지게 표시되면 디지털, 눈대중으로 볼 정도로 애매하면 아날로그라 봐도 좋다.
요즘엔 사전적 의미보단 디지털의 반대라는 뜻으로 아날로그란 말을 더 많이 쓴다. 사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분은 참 모호하다. 순수하게 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한 장치 안에서도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또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산다. 물론 매우 편리하며 효율적이다. 하지만 디지털이 모든 면에서 꼭 최고라곤 할 수 없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디지털에 익숙해질수록 반대로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비효율적이라는 한 마디로 치부하기엔 아날로그만의 매력이 못내 아깝다.
아날로그의 매력을 꼽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진공관 앰프다. 트랜지스터를 쓴 디지털 앰프와 비교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값도 비싸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공관 앰프를 찾는 이들이 있다. 특유의 풍성하고 따스한 음색을 느끼고 싶어서다. 차가운 디지털 앰프에서 이를 느끼긴 쉽지 않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매김했지만 반대로 새삼 필름 카메라를 찾는 이들도 많다.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바로 지울 수 있고 한번에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이기에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다. 반면 필름 카메라를 쓰면 셔터를 누를 때 좀 더 신중해진다. 인화하기 전 결과물을 기대하며 설레는 맛도 남다르다.
현실을 벗어던지기 힘든 이들에게 디지털 카메라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절충안도 있다. 과거 RF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는 것이다. 그 생김새와 손맛을 흉내냄으로써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흔든다.
▲ 사용자 감성에 호소한 디지털 기기, 갤럭시 노트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역시 아날로그 감성을 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미 시대에 밀린 ‘노트’라는 이름을 굳이 쓴 것만 봐도 그렇다.
감압식 대신 정전식 터치 방식이 대세가 된 이후 보기 힘들어진 스타일러스 펜도 다시 담았다. 비록 구현 방식은 다르지만 말이다. 성공 여부를 쉽게 점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다른 스마트폰, 태블릿과 차별화를 꾀하는 덴 성공했다.
사실 펜으로 쓰는 것은 분명히 직관적이지만 꼭 편리하다곤 할 수 없다. 지금은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라고 외치는 시대가 아니다. 엄지 타이핑이 훨씬 빠르고 익숙하다.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광활한 5.3형 액정이라지만 뭔가를 끄적대기엔 여전히 좁기만 하다. 디지털 부적응자를 포용하기엔 그들이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비록 갤럭시 노트의 성공을 쉽게 점칠 순 없겠지만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는 제품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배를 마시면서도 꾸준히 태블릿 PC가 출시된 것처럼 말이다.
이미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에 푹 젖어 있다.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메시징 서비스로 단문을 주고받는 데 익숙하다. 페이스북만 쓱 훑어보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의 근황도 쉽게 알 수 있다.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사서 읽는 시대가 됐다. 편지보다 이메일을 훨씬 자주 쓴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 각종 제약을 벗어던질 수 있는 디지털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론 공허하다는 생각도 든다. 왜일까? 아마도 인간은 아날로그적 존재인 탓일 것이다. 사람의 감정, 행동 등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겠는가.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에서 아날로그를 배제할 순 없으리라.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 아날로그를 찾는 이유다. 비록 그것이 늘 최선의 선택이 되진 않겠지만 말이다.
베타뉴스 방일도 (idroom@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목록
목록-
 위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