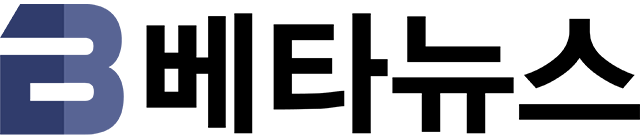입력 : 2011-02-07 10:24:13
설날 연휴에 인텔이 전해준 샌디브리지 리콜 소식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는 컴퓨터의 핵심부품이며, 무엇보다 이제 막 선보인 최신 제품, 데스크톱과 노트북 PC의 가장 상위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콜에 필요한 비용만 해도 대략 10억 달러 규모, 즉 1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는 순수한 리콜 비용이며, 샌디브릿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출하 지연이나 매출 부진 등에 따른 비용까지 합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참고로 이번 설 연휴에 큰 감동을 주었던 2011 동계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쓴 직간접 비용이 약 7천억 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
먼저 왜 리콜을 했는지를 살펴보자. 알려진 대로 지금껏 선보인 샌디브리지용 칩셋에서 SATA일부의 성능이 저하돼 하드디스크와 ODD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SATA 포트2에서 포트5까지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포트0과 포트1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 번째로 과연 이것이 리콜을 할 만큼 치명적인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인텔 발표에 의하면 지금껏 선보인 샌디브리지용 칩셋은 약 800만 개 정도다. 사실상 샌디브리지 칩셋은 인텔이 직접 만드는 P67과 H67이 독점하므로 이 숫자만큼 시장에 공급되었다고 봐도 좋다. 문제는 지금껏 선보인 대부분의 시스템이 데스크톱이 아닌, 노트북 PC라는 점이다.
노트북에서 SATA0과 SATA1 성능 저하가 치명적?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달아 쓸 수 있는 데스크톱과 달리 노트북에서는 하드디스크와 ODD의 개수가 사실상 한 개씩으로 제한된다. 달리 말해 인텔의 결함과는 전혀 무관한 포트0과 포트1을 쓴다는 뜻이다.
즉, 샌디브리지 칩셋의 이상이 시스템 성능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는 딱히 없다고 봐도 좋다. 게다가 인텔의 발표대로라면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하는 치명적인 영향도 없다. 그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다. 이 정도 문제를 리콜까지 할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
게다가 데스크톱쪽 사정을 살펴봐도 사실상 공급부족을 겪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샌디브리지다. 일 년 중 가장 PC가 잘 팔리는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샌디브리지는 강력한 성능과 대기수요로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기 절정의 제품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전 리콜은 어땠나?
그럼 이쯤에서 예전 인텔의 리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 번의 크고 작은 개선과 리콜이 있었지만 40여년 인텔 역사에서 가장 큰 리콜은 지난 1995년 펜티엄 프로세서의 FDIV버그에 따른 리콜이었다. 당시 인텔은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전체 프로세서를 교체해 줬고 그 비용은 5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번 리콜의 절반 정도였다. 참고로 당시 쓰던 컴퓨터에서 별 다른 이상이 없었고, 절차도 귀찮아 그냥 썼던 기억이 난다.
또 다른 리콜은 다름 아닌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 인텔 820칩셋의 버그로 인한 리콜이었다. 본디 램버스 램을 쓰도록 만들어진 820칩셋에 SD램을 쓸 경우 MTH(Memory Transfer Hub)의 결함으로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당시 기존 메인보드를 반납하면 새로운 메인보드와 당시로서는 너무 비싸서 쓰기 힘들었던 램버스램을 무상으로, 그것도 두 개나 주면서 사태는 마무리 되었다. 이때에도 메모리 비용까지 합쳐 약 5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마침 그 보드를 가지고 있었던 글쓴이는 최신 메모리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보드를 반납하고, 새로운 메인보드와 메모리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번 샌디브리지 리콜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그렇게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었다. 비록 MTH의 결함이라고는 하나, 당시 SD램을 쓴 820보드도 충분히 빠르고 쓸 만했다. 그보다는 기존 SD램이 프로세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려했지만, 그렇다고 DDR램은 쓰기 싫었고, 무엇보다 기술 우선주의가 만들어낸 묘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지금은 의심의 눈초리가 든다. 참고로 인텔의 기대와 달리 램버스램은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지금은 가끔 특허권 분쟁에나 등장하는 회사로만 기억에 남아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인텔의 전략 문제는 아닐까?
잘 알려진 대로 현재 CEO인 폴 오텔리니 이후의 인텔은 그전까지의 인텔과 많이 달라졌다. 엔지니어가 득세하고 기술이 우선하던 회사에서 일종의 마케팅 & 캠페인 회사의 모습까지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텔의 틱 & 톡 전략이다.
 |
취임 당시 AMD에 기술적으로 밀린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던 폴 오텔리니는 틱 앤 톡(Tick & Tock)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펼쳤다. 우리말로 하면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틱 앤 톡 전략은 프로세서의 개발 주기를 2년에 맞추고 한 번은 한 번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모델(Tick)을 선보이며, 다른 주기에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개량형 모델(Tock)을 선보인다는 뜻이다. 이는 폴 오텔리니의 최대 업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텔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략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때 CPU만 아니라 칩셋까지 선보이는 것은 인텔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사실 틱 앤 톡 전략의 우리말 이름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에 문제된 P67/H67만 해도 소켓의 구조와 수가 기존 P65/H65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프로세서는 물론 칩셋까지 바꿨다. 만약 인텔이 대단한 마케팅 능력과 시장 지배력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기도 하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큰 돈이 안 되는 업그레이드 수요보다는 시스템을 바꾸거나, 적어도 메인보드를 바꾸는 인텔의 틱 앤 톡 전략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참고로 AMD 플랫폼의 경우 몇 년 지난 보드에도 여전히 최신 프로세서를 쓸 수 있으며, 인텔 역시 틱 앤 톡 전략을 선보이기 이전에는 CPU와 칩셋의 개발 주기를 정확히 일치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요즈음 선보이는 프로세서라고 해서 반드시 CPU가 바뀔 때마다 칩셋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칩셋과 CPU의 교체 주기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안정성의 담보효과도 나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지금처럼 많은 이익이 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과연 이번 인텔의 샌디브리지 리콜이 단순한 리콜로 그칠지, 아니면 인텔의 전략까지 바꾸는 계기가 될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베타뉴스 김영로 (bea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목록
목록-
 위로
위로